중이 제 머리는 못 깎는 법이다. 좋은 교사는 될 수 있어도, 교사로서 자기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는 무척 어려운 것 같다. 왜 그런 것 있잖은가. 학교에서 늘 수업하는 전공과목조차, 똑같은 내용을 집에서 자기 아이를 앉혀놓고 가르치자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것 말이다. 교사 부모라고 특별할 건 없지만, 그들이 자기 아이들과 더 소통이 안 되고, 외려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등골 브레이커'보다 더 무서운 스마트폰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를 하는 데에 가장 큰 화두가 스마트폰이다.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던 다운 점퍼의 전성시대가 가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꿰차며 아이들 사이의 새로운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떤 기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며, '기변'의 횟수가 유행 민감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됐다. '잘 나가는' 아이들일수록 그들의 손에는 '신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다.
그런데, '등골 브레이커'가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와 맞닿아 있었을지언정,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마치 학교폭력의 원흉처럼 지목됐지만, 그저 값나가는 방한용 '옷'이었기에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으로 믿었고, 예상대로 한두 해의 반짝 유행으로 끝났다. 지내 놓고 보니, 학교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지금의 스마트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하찮은' 일이었다.
사실상 모든 학교는 스마트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소지 또는 사용을 금한다' 정도의 교칙이 고작이다. 그나마 아이들의 '준법의식'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항이다. 학교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기성세대인 교사들이 이른바 '스마트폰 세대'를 감당하기란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이 차츰 준비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수업 방해와 중독 등 스마트폰이 가져온 부작용의 확산 속도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비유컨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지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뿐이라는 한탄이 나오겠는가.
그나마 학교에는 전근대적이라고 조롱받을지언정 어쨌든 교칙이라는 게 있다. 더욱이, 교칙이라는 외적 강제와 함께, 그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입시 준비라는 내적 제어 수단이 작동하고 있기에 생활지도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떨까.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의 진앙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일임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스마트폰 사달라는 5학년 아이, 어떡하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는데, 큰 아이가 5학년이 되니 부쩍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듣자니까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는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떼를 쓰면서 시작된다고들 한다.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단연 스마트폰이고, 얼마 전부터는 두발과 복장 제한 규정이 사라진 이후 스마트폰 소지 허용이 교칙 개정에 있어 학교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과 친해지자면 카톡 정도는 기본이고, 웬만한 게임 같은 건 알고 있어야 대화에 낄 수 있단다. 안 다니면 놀 친구가 없어 학원에 간다더니만, 스마트폰이 딱 그 꼴이다. 심지어 요즘엔 학교 숙제를 하는 데도 태블릿 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의 '스마트폰 예찬론'을 듣고 있노라면,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이 어느새 구닥다리가 돼버린 느낌이다.
여하튼 큰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은연 중에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빠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만 사주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겠다며 자청 내기를 걸기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돕겠다며 '흥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애써 사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솔직히 나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때 함께 생각해보자며 눙치곤 한다.
물론, 선뜻 사줄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적어도 스마트폰에 관한 한 '아빠'이기보다는 '교사'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서다. 학교에서의 고충을 모른다면 모를까. 명색이 아빠가 교사인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 수야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 학교도 속수무책으로, 가정교육만 원망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어쭙잖은 설득으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기란 쉽지 않다. 누구 말마따나 TV만 켜면 온통 스마트폰 광고뿐인데, '대세'를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거다. 며칠을 고민하다 나름의 '모범답안'을 찾아냈다. 거창하게 비유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자면 내 팔 한 쪽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걸려오는 전화는 받되, 집에서는 마련한 스마트폰 함에 넣어두고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시도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 습관일 뿐이었네
사실 이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개 교사들은 출근과 함께 교무실 책상 서랍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꺼내 쓴다. 이따금 수업 중 호주머니에 둔 스마트폰이 울려 낭패를 본 교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하긴 아이들에겐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지니지 못하도록 해놓고, 정작 교사들이 교실에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찌 영이 서겠는가.
이는 한때 집에만 오면 TV 리모컨부터 찾던 아이의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부부가 TV를 끊었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애니메이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TV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예 TV를 켜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모두 예전에 즐겨봤던 <개그콘서트>를 어색해 하고, 최고의 시청률로 장안의 화제였다는 <응답하라 1994>가 얼마 전까지 무슨 다큐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TV가 벽에 걸린 그림 액자처럼 장식품이 된 후 얼마 동안은 집이 너무 조용해 썰렁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외려 우리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했다.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소파에 기대 함께 TV를 보다 잠자리에 들었던 저녁시간이 다른 일로 채워진 것이다. 책도 읽고, 가끔 마실 가듯 산책도 하고. 말하자면, 하루가 길어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전히 아이는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면 다가가 힐끗 쳐다보긴 하지만, 그때뿐 요즘 들어 떼쓰듯 조르는 일은 없다. 섣부른 짐작이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 같다. 굳이 필요하면, 보관함에서 아빠, 엄마 것을 꺼내 쓰고 다시 넣어둔다. 이름 하여 '스마트폰 셰어링(sharing).' 단 한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그저 습관일 뿐이라는 걸 시나브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구세대' 부모의 욕심이자 시대의 변화에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일 테지만,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연필과 수첩이 자주 쥐어지기를 소망한다. 빠른 손놀림의 '엄지족'이 아니라, 반듯한 글씨체를 지닌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이 아닌, 종이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했으면 하고,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는 것보다 책장 넘기는 재미를 우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설마 그런다고 '디지털 문맹'이 되기야 하겠는가.
'등골 브레이커'보다 더 무서운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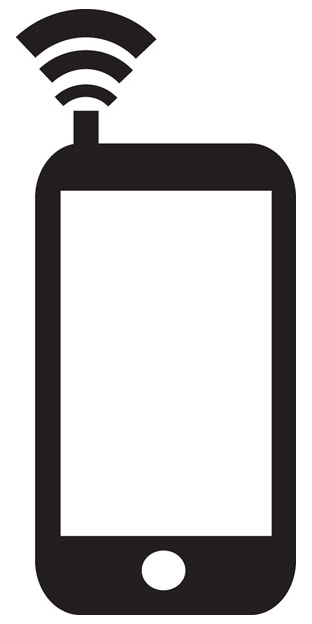 | |
| ▲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지도를 하는 데에 가장 큰 화두가 스마트폰이다. 한때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던 다운점퍼의 전성시대가 가고, 그 자리를 스마트폰이 꿰차며 아이들 사이의 새로운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다. | |
| ⓒ sxc | |
그런데, '등골 브레이커'가 갈취 등 학교폭력 문제와 맞닿아 있었을지언정,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마치 학교폭력의 원흉처럼 지목됐지만, 그저 값나가는 방한용 '옷'이었기에 오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것으로 믿었고, 예상대로 한두 해의 반짝 유행으로 끝났다. 지내 놓고 보니, 학교교육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지금의 스마트폰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은 '하찮은' 일이었다.
사실상 모든 학교는 스마트폰에 대해 속수무책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교 내에서는 소지 또는 사용을 금한다' 정도의 교칙이 고작이다. 그나마 아이들의 '준법의식'에 기대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조항이다. 학교마다 부랴부랴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기성세대인 교사들이 이른바 '스마트폰 세대'를 감당하기란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교사 연수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이 차츰 준비되고 있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수업 방해와 중독 등 스마트폰이 가져온 부작용의 확산 속도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비유컨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지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죽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뿐이라는 한탄이 나오겠는가.
그나마 학교에는 전근대적이라고 조롱받을지언정 어쨌든 교칙이라는 게 있다. 더욱이, 교칙이라는 외적 강제와 함께, 그보다 몇 배는 더 강력한 입시 준비라는 내적 제어 수단이 작동하고 있기에 생활지도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럼 가정에서는 어떨까. 솔직히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의 진앙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일임한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스마트폰 사달라는 5학년 아이, 어떡하지?
작년까지만 해도 미처 몰랐는데, 큰 아이가 5학년이 되니 부쩍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듣자니까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는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떼를 쓰면서 시작된다고들 한다. 남녀 학생 구분 없이 가장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단연 스마트폰이고, 얼마 전부터는 두발과 복장 제한 규정이 사라진 이후 스마트폰 소지 허용이 교칙 개정에 있어 학교마다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학교 안팎에서 친구들과 친해지자면 카톡 정도는 기본이고, 웬만한 게임 같은 건 알고 있어야 대화에 낄 수 있단다. 안 다니면 놀 친구가 없어 학원에 간다더니만, 스마트폰이 딱 그 꼴이다. 심지어 요즘엔 학교 숙제를 하는 데도 태블릿 피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의 '스마트폰 예찬론'을 듣고 있노라면, 데스크톱 컴퓨터나 노트북이 어느새 구닥다리가 돼버린 느낌이다.
여하튼 큰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은연 중에 사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빠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만 사주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겠다며 자청 내기를 걸기도 하고, 설거지와 청소 등 집안일을 돕겠다며 '흥정'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애써 사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솔직히 나조차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때 함께 생각해보자며 눙치곤 한다.
물론, 선뜻 사줄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적어도 스마트폰에 관한 한 '아빠'이기보다는 '교사'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서다. 학교에서의 고충을 모른다면 모를까. 명색이 아빠가 교사인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줄 수야 없지 않겠는가. 어차피 그 학교도 속수무책으로, 가정교육만 원망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어쭙잖은 설득으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놓기란 쉽지 않다. 누구 말마따나 TV만 켜면 온통 스마트폰 광고뿐인데, '대세'를 어찌 거스를 수 있겠느냐는 거다. 며칠을 고민하다 나름의 '모범답안'을 찾아냈다. 거창하게 비유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취하자면 내 팔 한 쪽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걸려오는 전화는 받되, 집에서는 마련한 스마트폰 함에 넣어두고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시도 놓지 못하던 스마트폰, 습관일 뿐이었네
 | |
| ▲ 스마트폰. | |
| ⓒ 김시연 | |
사실 이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개 교사들은 출근과 함께 교무실 책상 서랍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꺼내 쓴다. 이따금 수업 중 호주머니에 둔 스마트폰이 울려 낭패를 본 교사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하긴 아이들에겐 수업시간 스마트폰을 지니지 못하도록 해놓고, 정작 교사들이 교실에 가지고 들어간다면 어찌 영이 서겠는가.
이는 한때 집에만 오면 TV 리모컨부터 찾던 아이의 그릇된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부부가 TV를 끊었던 경험을 되살리는 것이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애니메이션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TV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예 TV를 켜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모두 예전에 즐겨봤던 <개그콘서트>를 어색해 하고, 최고의 시청률로 장안의 화제였다는 <응답하라 1994>가 얼마 전까지 무슨 다큐 프로그램인 줄 알았다.
TV가 벽에 걸린 그림 액자처럼 장식품이 된 후 얼마 동안은 집이 너무 조용해 썰렁하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외려 우리 가족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했다.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소파에 기대 함께 TV를 보다 잠자리에 들었던 저녁시간이 다른 일로 채워진 것이다. 책도 읽고, 가끔 마실 가듯 산책도 하고. 말하자면, 하루가 길어진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전히 아이는 누군가 스마트폰을 꺼내 만지작거리면 다가가 힐끗 쳐다보긴 하지만, 그때뿐 요즘 들어 떼쓰듯 조르는 일은 없다. 섣부른 짐작이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와 '필요'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 같다. 굳이 필요하면, 보관함에서 아빠, 엄마 것을 꺼내 쓰고 다시 넣어둔다. 이름 하여 '스마트폰 셰어링(sharing).' 단 한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건, 그저 습관일 뿐이라는 걸 시나브로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구세대' 부모의 욕심이자 시대의 변화에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일 테지만,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이 아닌 연필과 수첩이 자주 쥐어지기를 소망한다. 빠른 손놀림의 '엄지족'이 아니라, 반듯한 글씨체를 지닌 사람으로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이 아닌, 종이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했으면 하고, 손가락으로 '드래그'하는 것보다 책장 넘기는 재미를 우선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설마 그런다고 '디지털 문맹'이 되기야 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