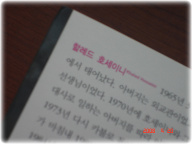"연을 쫓는 아이"는 소련의 침공과 내전, 분쟁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영화에 출연한 세 아이에 대한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를 우려해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 했다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영화의 일부 장면을 문제삼아 상영을 금지했다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솔직히 우리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짐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뉴스를 통해서, 혹은 잡지 나 신문을 통해서 가끔 그네들의 아픈 상황을 보긴 합니다. 저도 시사 프로그램, 시사 잡지를 보면서 어렴풋이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먼나라에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종교, 문화 탓에 가슴에 와닿는다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멀게 느껴지는 아프가니스탄은 대한민국과 같은 '아시아권' 나라에 속합니다)
영화는 외부의 침략과 내전에 휩쌓이기 전의 평화롭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불안한 기운은 시작되고 있었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우정 키워가던 두 소년이 멀어지는 (빌어먹을) 사건이 생깁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상황보다, 주변을 둘러싼 상황은 더 급박하게 흘러가게 되고... 그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살던 두 아이를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이 힘겨워 했던 지난 시간동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고, 변해야했고, 힘겨워 해야 했는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편하지만은 않은 장면들과 상황들을 따라가다보면, 관객은 호흡을 줄이고 긴장 할 수 밖에 없게 되더군요. 탈레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말일 뿐이지만, 영화에서 그 말은 섬뜩한 현실속의 조직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현상황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지나온 상황과도 흡사 닮아 있습니다. 외국의 침략, 그리고 곧 이어진 자국내의 전쟁. 아마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간직한 탓에 영화속에 장면이 완전 낯설지도 않나봅니다.

닷새를 일하고 이틀을 쉬라 했든
엿새를 일하고 하루를 쉬라 했든
일요일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시간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다행일 수가....
'연을 쫓는 아이'의 마지막 200 여 페이지를 주절르고 앉아 읽을 수 있었다.
늘 조각난 시간, 시간을 조각내어 책을 읽는 내 습관대로 이 책의 마지막 200 여 p를 버스 안에서 읽기 시작했더라면
난 어쩌면 종점까지 갔을지도 모르지. 사람이 살다보면 결근도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철통같은 정신적 무장은 애당초 내게는 없었으므로 난 때로 일탈을 꿈꾸고 결근을 꿈꾸고 멀리 달아나 꼭꼭 숨는 것을 꿈꾸고 있으므로.
좋은 이야기 하나를 부여잡고 하루를 온통 숨어 읽는다해서 징계 대상이 될 리는 만무일테니.
책장을 덮으면서 왜 나는 이런 생각부터 한 걸까?
그리고 이 책을 누구에게 주어야겠는지, 이것 좀 읽어보라고 내 손때 묻힌 채 건네주어야 할 이가 누군지를 먼저 뒤적였을까?
성장소설이다.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한 아이의 성장, 삶의 길을 그리면서 작가는 많은 것을 고한다, 독자에게.
제발 내가 이렇게 우회하여 일러바치는 조국 아프카니스탄의 비극을 알아들어주기를
그래서 그 비극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세상의 독자들에게 원하고 있다,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주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미국으로 망명하여 의사로 성공한 한 남자가 이런 장대한 소설을 집필하기까지 그의 내면에서 한 시도 떠날 수 없었던
암울한 조국, 아프카니스탄에 관한 그의 절망이 소설 곳곳에서 튀어나올 때마다 '영어로 집필한 아프카니스탄 최최의 소설'로서의 감탄이 아니라
이런 방대한 양의 소설을 첫 작품으로 내놓은 것은 할레드 호세이니라는 작가의 재능이 아니라 작가의 절박함이었을 거라고.
마루에 시트로 급조한 기도용 깔개를 깐 다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시트에 스며들었다. 서쪽을 향해 절을 하다가, 내가 15년 넘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도문은 오래 전에 잊어버렸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아직 생각나는 몇 마디 기도문을 계속 외웠다.
"알라신만이 존재하며 무하마드는 신의 사자이다."
나는 바바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 신은 존재하고 항상 존재했었다. 이곳 복도에 있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눈에서 나는 신을 보았다. 밝은 다이아몬드 빛과 높이 솟은 광탑이 있는 하얀 사원이 아닌, 바로 이곳이 진정한 신의 집이며 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신을 찾게 되는 곳이었다. 신은 존재하며 신은 존재해야한다 . 그동안 신을 홀대한 것에 대해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 벌을 받지 않은 채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다가 내가 필요하자 이제 와서 신을 찾는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코란에서 말한 대로 신이 자비롭고 인자하며 은혜가 넘쳐흐르길 빌었다. 서쪽을 향해 절을 하고 바닥에 입을 맞추면서 헌금과 기도를 하겠다고,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하고 라마단이 끝나도 단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신의 성서에 들어있는 마지막 구절까지 다 외울 것이며 사막에 있는 그 무더운 도시로 순례를 떠나 카바 앞에 절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할 것이며 오늘부터 매일 신을 생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참 여러 번 안경을 벗곤 했다.
556 쪽의 묵직한 무게를 감당하기엔 내 눈은 늙었지만 내 가슴은 아직 살아 있었다.
도무지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서 내동댕이 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여 절대 안 하는 짓,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는 짓을 하고야 말았다.
그리고
다시 안경을 찾아 쓰고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읽었다.
더 이상의 절망은 없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작가가 그렇게 잔인하진 않을 거야.
인터넷을 접속하니 서울대생인, 공부보다는 돈을 택한 세기적 미녀의 얼굴이 뜬다.
오늘에야 내가 왜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곤 하지 않았는지, 그녀에게 보내는 수많은 찬사에 동감하지 않았는지 알았다.
팔랑대는 그녀의 웃음, 옷자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얄팍한 욕망이 메스꺼워온다. 늘 그런 인간들에게 소름이 돋았듯.
묵직한 추 하나를 매달고
가슴 언저리 어느 한 곳에 그 추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다.
책꽂이 한 켠에 꽂아둘 거다. 아무도 안 빌려줄 거다. 읽으라고 권해주지도 않을 거다.
가벼운 손놀림으로 책장을 넘기고, 그보다 더 가벼운 입놀림으로 작품을 이야기하면 뺨이라도 갈겨버릴 것 같아서 말이지.
그의 두 번째 작품이라던가?
천 개의 찬란한 태양
그 책이 내 책꽂이 한 쪽에 꽂혀있어 좋다.
숨을 좀 고르고
다시 뛰어들 수 있는
깊은 심연의 이야기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늘 살아있어 행복한 이유이곤 하다.